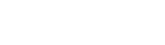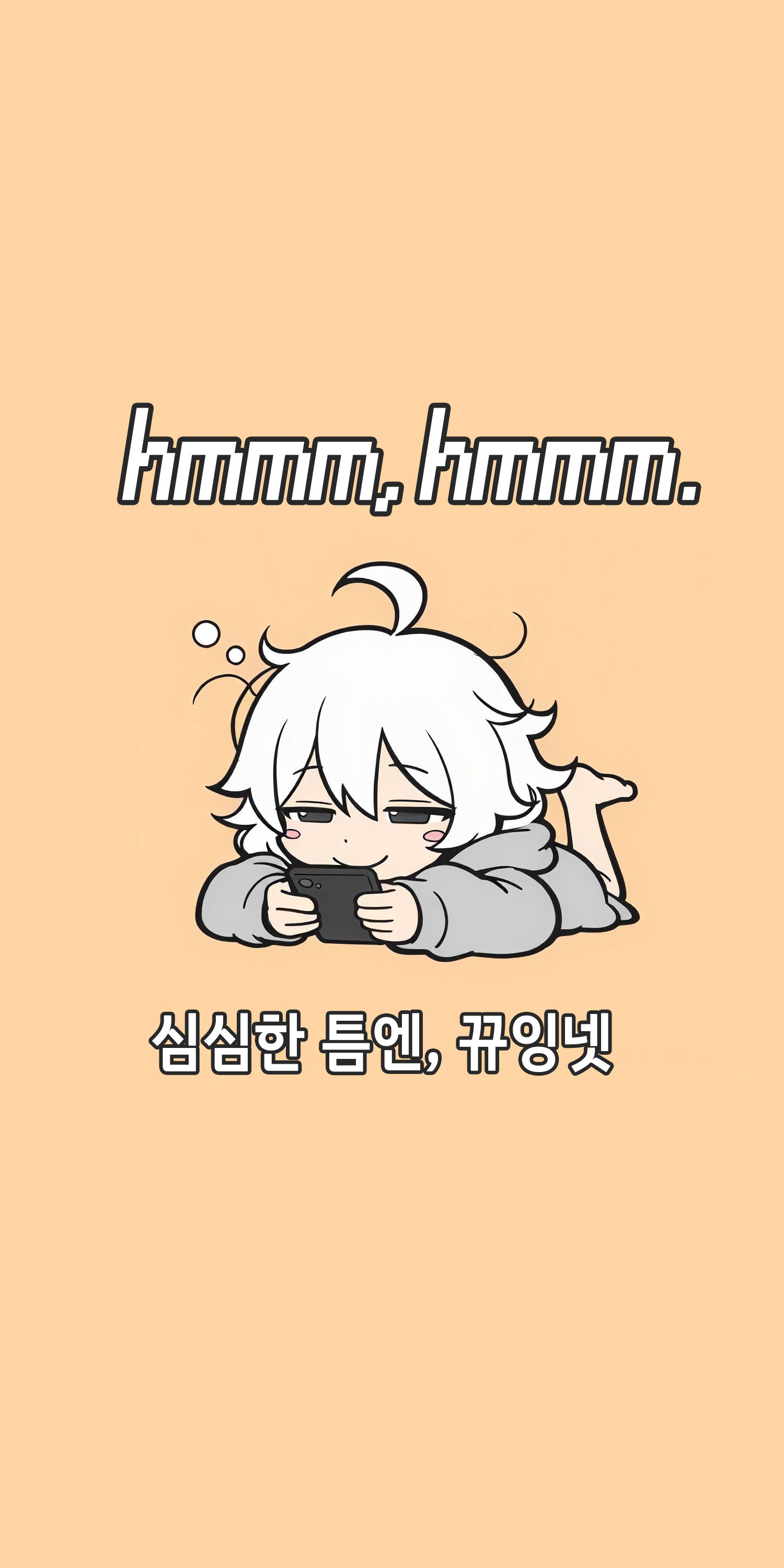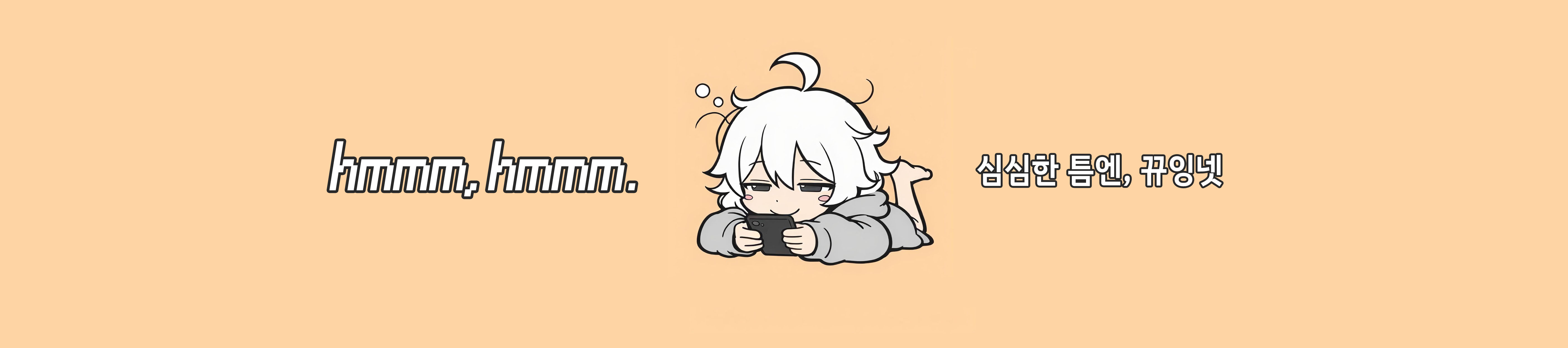화봉요원 68권 간단감상2 - 536화 賴
본문
536화의 제목은 ‘지극한 부드러움과 지극한 강함(至柔至剛)’입니다. 여기서 至柔는 노자가 지은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天下之至柔,馳騁天下之至堅。無有入無間,吾是以知無為之有益。不言之教,無為之益,天下希及之。
천하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리며, 형체가 없는 것(無有)은 틈이 없는 곳까지 들어가니. 그러므로 나는 무위의 이로움을 알았다. 말없는 가르침과 무위의 이로움. 온 천하를 둘러보아도 이에 미치는 바가 없다 도덕경 43장
도덕경에서는 지극히 부드러운 것의 대표로 ‘물(水)’을 들고 있습니다. 지극히 단단한 것의 대표는 ‘바위(石)’으로 들고 있지요. 따라서 도덕경 43장을 다시 풀어 써보자면,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이, 천하에서 가장 굳센 금석을 마음대로 주무른다‘할 수 있습니다.
이 논술은 여러 차례 보강되는데, 관련한 대표적인 지문으로는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으나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여 이길 수 없는 것으로 물보다 나은 것은 없다(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莫之能勝 도덕경 78장)”가 있습니다.
사물에 있어서 ‘지극히 부드러운 사물’은 ‘물’이 라지만, 우리 몸에 있어 ‘지극히 부드러운 부위’하면 ‘혀(舌)’만한 것이 없지요. 그리고 물과 혀는 여러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은 형체가 없고 어떤 사물에도 자신을 맞추려 하며, 흐르는 성질만 있어 일견 약해보입니다. 하지만 물이야말로 틈 없는 곳까지 스며들고, 사방으로 뻗치며, 모이면 바위를 뚫고, 천 길의 절벽도 깎아내며, 천 척의 배도 실어나를 강을 이룹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부위 중 가장 연약하여 일견 쓸모없어 보입니다. 허나 나이를 먹음에 딱딱하고 푸석푸석해지는 다른 부위와 달리, 혓바닥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움으로 황제조차 모골을 송연하게 만들며, 천고에 이름을 남기고, 사람의 마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부드러운 혓바닥으로 천하조차 손에 넣을 수도 있지요.
제 아무리 강한 상대를 가져온다 한들, 물과 혀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극한 부드러움이 지극히 강한 것입니다.
인용한 ‘도덕경’의 맥락에 끼워 맞춰보면, 536화의 제목이 내포하는 것은 ‘지극한 부드러움至柔’이 ‘지극한 강함至剛’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등장한 ‘화면’에는 위연과 유비 2명이 그려져 있군요.
그 말인즉슨, ‘지극한 부드러움’은 곧 혀(舌), 다시 말해 유비를 가리킴이요, ‘지극한 강함’은 반대편 위연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해설하자면 이렇습니다.
위연은 현재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투항하면 유비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껏 투항하고 난 뒤에도 변변찮은 임무만 맡고 있거든요. 전선에 나가있는 방통 대신 자기가 나서도 훨씬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유비 곁에서 호휘 임무만 맡자니 화가 치밀죠.
다. 그래서 살짝 삐딱한 태도로 유비에게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저리 복잡한 계획을 짜면서 방통을 부릴 바에, 5천의 병력만 자기한테 내주면 서천을 눈깜짝할 새 점령해 보이겠다고.
당연히 다른 장령(將領)들이 보기에는 기가 찹니다. 최고 사령관인 방통이 고심을 기울여 가며 짜놓은 입천(入川)의 대계(大計)가 이제야 펼쳐질 참인데, 자기가 뭐라도 된 양 방통을 무시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것도 공을 세운 항장(降將) 명단에서 가장 끝 순위에 있는 놈이 그러니 더욱 열이 뻗칩니다.
하지만 유비는 그런 위연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 지극히 부드러운 혀(舌)로 그의 성품을 어루만지고 통(通)하게 하며 풍족하게 만듭니다. 그의 자(字)이기도 한, 도덕경 10장에 나온 현덕(玄德)처럼요.
도덕경에서 현덕(玄德)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낳으면서도 가지지 않고, 행하되 (행하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으며, 자라게 하되 다스리지 않는 신묘한 원리라고. 만물을 낳아주고 길러주며, 그 근원을 금지하지 않는 것.
‘현덕’의 정의대로, 유비는 위연에게 자상히 타일러주는 겁니다. 네가 전면에 나설 무대는 여기가 아니라 따로 있다면서요.
지금은 방통의 무대지만 위연이 활약할 무대는 나중에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지극히 강한’ 성품을 품어주는 겁니다.
왜냐햐면, 유비의 주위에 뢰(賴;신뢰하다)할 수 있는 사람은 2명- 지(知)와 용(勇)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용(勇)은 바로 위연이고.
유비는 마지막의 마지막에 자신이 신뢰할 사람은 위연이라 진술하며, 그가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가 되는데 필요한 품격이 많지만, 그 중 세 개를 꼽자면, 인(仁), 지(智), 그리고 용(勇)이라 했습니다.
君子道者三,我無能焉:仁者不憂,知者不惑,勇者不懼
“군자의 도 세 가지 중에 나는 능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인자는 근심하지 않고, 지자는 의혹하지 않고, 용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子貢曰 夫子自道也
자공(子貢)이 말하였다. “공자께서 스스로 겸양하신 말씀이다.”
『논어』 헌문憲問편 28절.
子曰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미혹되지 않고, 인(仁)한 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맹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논어』 자한(子罕)편 29절
제갈량은 지자(知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밝으니 미혹되지 않습니다.
위연은 용자(勇者)입니다. 용맹한 이는 적을 무찔러 침략을 막아내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자(仁者)는 운명을 알아 마음속으로 살펴도 허물이 없으니,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맹한 이가 ‘두렵지 않다’는 것은 힘이 세거나 잘싸운 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를 함양하고 수호하며, 강직하고 아첨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가정의 시점은 사람들이 떠나고 난 이후를 상정하고 있으니, 굳이 끼워 맞추자면 저기서 ‘인자’는 유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연은 자신을 인정해준 유비에게 감사를 포하며 포권을 취하는 것이죠.자신이 제대로 된 주인을 택한 것을 마음에 들어하면서요.
그런데 잠깐, 유비의 대사를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비 : 大將走了, 備身邊有誰可賴?
대장(방통)이 떠난 뒤, 비의 신변에는 뢰(賴)할 수 있는 이가 있는가?
내재적 관점으로는, ‘방통의 무대’가 아닌 ‘위연의 무대’를 겨냥한 대사입니다.
하지만 외재적 관점으로는 어떨까요? 작가는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대장(방통)이 물리적인 의미로 떠나면(죽는다면), 유비의 곁에 신뢰(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갈량(知) 하나, 그리고 위연(勇) 하나 있습니다. 둘만으로 유비의 가장 위급한 순간을 대처하기에 능할까요?
오호대장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장비가 대답합니다
불뢰(不賴)라고.
원래 不賴는 ‘제법이다, 적절하다, 실력이 상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작중에서는 성을 지키는 이(사마의라는 건 모릅니다)의 전술적 대응에 감탄하며 不賴라는 감탄사를 내뱉은 것이죠.
하지만 외재적 관점에선, 장비는 방통이 죽고 난 뒤에 널 신뢰해도 괜찮을까?란 유비의 질문에 장비가 고개를 젓는 겁니다.
자신은 신뢰할 수 없다고.(不賴)
당신이 가장 위급한 순간인이릉대전의 때에 자신은 죽은 몸이라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고(不賴)
당신의 가장 위급한 순간은 저 둘만으로 신뢰가 불가능하며, 대처할 수 없기에 철저히 패배하고 말리라고.
또한 황충도 말하죠
불뢰(不賴), 자기 역시 죽어 없어질 몸이라고.
작가님은 지극한 부드러움이 지극한 단단함을 주무르는 과정속에서도,
그 지극한 부드러움조차 결국 단단함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불길한 떡밥을 삽입하고 있는 것입니다.